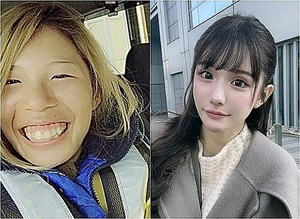지난달 22일 오전 강원 춘천 효자동의 한 무인점포에서는 경찰의 긴박한 검거 작전이 펼쳐졌다. 새벽 시간 매장에 무단 침입해 8시간 무전취식을 하던 A(41)씨는 출입문 건전지를 빼내고 냉장고로 출입문을 막았다. A씨를 붙잡기 위해 경찰은 점포로 통하는 도주로를 차단하고 출입문에는 강제 개방조를, 건물 뒤편 창문에는 침투조를 배치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고 한다. 며칠 전에는 충북 청주에서 한 달여간 무인점포 15곳을 돌며 20여차례 식료품을 훔친 40대가 구속됐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비대면 일상화와 인건비 상승,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의 등장이 맞물리면서 ‘무인(無人)’ 시대가 열렸다. 식당, 편의점, 카페뿐만 아니라 PC방, 주유소, 사진관, 스터디 카페 등 사회 곳곳에 무인매장이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전국의 무인점포 수는 10만곳이 넘는다. 창업 비용이 저렴하고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고객과 불필요한 충돌도 있을 리 없다. 이용자들이 만족한다. 점주·아르바이트생과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 오랫동안 마음 편하게 물건을 고르다가 사지 않아도 직원 눈치를 안 봐도 된다. 구인난에 서빙로봇 도입도 급증한다. 올해 국내 서빙로봇 시장 규모는 1만대를 넘는다. 월 200만원(최저임금 기준) 인건비 대신 20만∼30만원의 렌털 비용이면 끝이다.
이래저래 사람 만나기 힘든 세상이다. 무인매장이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만 있는 건 아니다. 무인매장은 범죄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사설 보안 비용이 부담스럽다 보니 점포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고작이다. 크고 작은 절도와 쓰레기 투기, 주취자가 넘쳐난다. 난감해진 건 경찰이다. 경찰서 전화기는 불이 날 지경이다. “냉동고 문이 열려 있어 닫아 달라”는 신고까지 들어온다.
업주들의 잦은 순찰 요구와 민원에 ‘공권력 도둑’, ‘치안 외주’라는 비판이 나올 지경이다. 무엇보다 무인매장 절도 대다수가 소액인 데다, 범인 상당수가 10대라서 투입한 공권력에 비해 처벌은 쉽지 않다. 개인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찬반도 팽팽하다. 경찰력 분산과 점주 피해를 막을 묘책이 시급하다. 갈수록 일자리는 줄고 인건비는 상승하는 디지털 시대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의협 회장 탄핵 위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67.jpg
)
![[기자가만난세상] 美 애틀랜타 교포가 기 펴는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13.jpg
)
![[세계와우리] 北의 우크라戰 참전, 방관할 수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63.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이게 다는 아닐 거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24.jpg
)